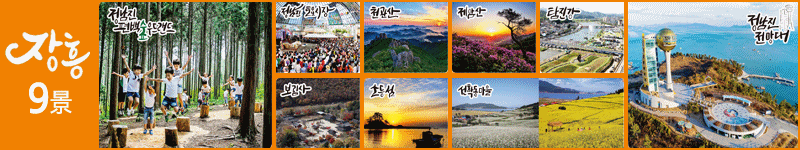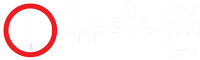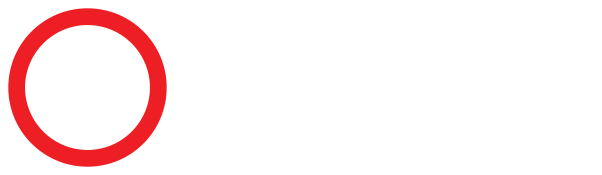그야말로 찜통더위를 넘어 가마솥더위다. 장마가 끝나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기온은 38도 가까이 치솟는 지역까지 생겨나, 사람 체온을 넘어선 폭염에 “한증막 같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그야말로 찜통더위를 넘어 가마솥더위다. 장마가 끝나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기온은 38도 가까이 치솟는 지역까지 생겨나, 사람 체온을 넘어선 폭염에 “한증막 같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게다가 열대야까지 겹쳐 더위를 피할 곳조차 없다. 결국 밤새 에어컨에 의존해 겨우 숨을 돌린다. 전기요금이 걱정인 가정들은 통풍이 잘 되는 집 밖 그늘을 찾아 삼삼오오 모여앉아 부채질로 더위를 식힌다. 해가 지고 햇살이 물러나야 비로소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열대야 탓에 집안조차 숨 막힌다. 에어컨을 틀지 않고는 버틸 수 없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러운 이들은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를 껴안고 버틴다. 아예 마당이나 골목에 자리를 펴고 더위를 견디는 서민들도 있다. 무더위가 그 자체로 빈부 격차를 드러내는 것이다.
문득 어릴 적 고향의 기억을 떠올려 더위를 달래본다.
고향집 흙담벽 사이로는 골바람이 시원하게 불었다. 집 뒤편 탱자나무 울타리가 서쪽 햇살을 막아주는 그늘진 자리, 방과 후 지게를 펴고 그곳에 누우면 온몸을 뒤덮은 땀이 산들바람에 씻겨 나갔다. 피부는 뽀송해졌고, 소금꽃처럼 하얀 결정이 피부에 맺혔다. 그곳이 내겐 최고의 피서지였다. 낮잠을 자거나 무협지를 읽으며 더위를 견뎠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시절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귀했다. 대부분의 농촌이 그랬다. ‘찜통더위’나 ‘가마솥더위’ 같은 표현조차 몰랐다. 손부채로 더위를 쫓고 시원한 바람을 따라 피서를 다녔다. 마을 어귀 연못에서 멱을 감고, 모내기로 물이 빠지면 인근 강으로 원정을 가기도 했다. 해질녘까지 강물에서 놀다 어스름이 깔릴 무렵에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어머니의 걱정을 무시하고 외출했다가 꾸지람을 들었지만, 그 시절은 마냥 즐거웠다. 햇볕에 그을려 피부가 벗겨져도 선크림이란 걸 알지 못했고, 구릿빛 피부를 자랑삼아 드러내고 다니기도 했다. 짚 앞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장구를 치며 뛰놀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가물어 시냇물조차 말랐을 땐 동네 우물에서 길어온 지하수로 등목을 하며 더위를 식혔다. 그 얼음장 같은 냉수로 어머니께서 등목을 해주시던 추억은 여전히 마음 깊이 남아 있다. 그 시절의 여름은 힘겨움보단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 자체로 계절의 일부였다. “더워야 곡식이 여문다”는 아버지 말씀은 아직도 귓가를 맴돈다. 최고의 피서는 자연이 몰고 오는 바람이었고,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는 집 앞 고목나무 그늘이 참으로 고마운 피서지였다.
이열치열의 방식으로 더위를 이겨내기도 했다. 냉수나 찬 음식으로 탈이 나기 일쑤였기에, 오히려 더운 음식을 먹으며 몸의 균형을 잡았다. 때로는 산을 오르며 땀을 흠뻑 흘렸다. 땀방울이 온몸을 타고 흐른 후, 정상에서 맞이하는 산들바람은 천상의 시원함을 선사했다. 그때 느낀 이열치열의 쾌감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지금도 여름이 되면 문득 그 기억이 떠올라 일부러 이열치열의 음식을 찾게 된다.
기후 변화로 예전보다 무더위가 심해졌다고들 하지만, 과거에도 여름은 충분히 더웠다. 물론 과학적으로는 현재가 훨씬 더 기록적인 폭염이라 하지만, 당시를 떠올리며 자연과 함께 견뎠던 방법과 인내의 미덕으로 다시 이열치열에 도전해보곤 한다. 사우나의 한증막처럼 땀을 흘리며 더위를 이겨보려는 것이다.
기후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인간은 이제 더위와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이다. 인위적인 피서지보다는 자연 속에서 방법을 찾고자 한다. 선풍기나 에어컨이 편리하긴 하지만, 자연 바람만 못하다는 생각은 여전하다. 기계에 의존하는 피서는 어쩌면 신의 질서에 도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혹서가 자연의 순리라면, 그 역시 순리로 극복해보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닐까.
땀을 흘리더라도 자연풍을 맞으며 책을 읽고 산책을 하다 보면, 어느새 더위도 잊게 된다. 무덥다고 아우성치기보단 그 속에서 견디고 극복하려는 태도 또한 필요하다. 전기요금 걱정 대신 자연에 몸을 맡겨보자. 더우면 더운 대로 그 여름을 즐겨보자. 피하려 애쓰기보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찾아보자. 결국, 나만의 피서법은 그 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