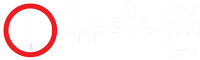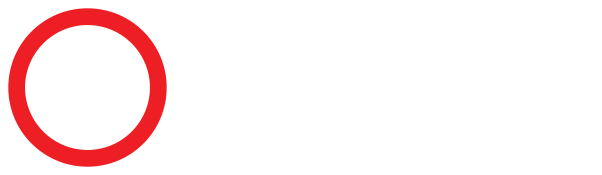“신인 문학상에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을 먼저 보주시면 작품과 함께 이번 봄호에 싣고자 합니다.” 뜻밖의 낭보에 어리둥절했다. 메일을 확인하고서야 당선을 실감했다.
 아내와 사무실 동료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기대했던 반응보다 차분하게 느껴졌다. 환호하며 기뻐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축하한다”는 의례적인 인사로만 들려 섭섭한 감이 들었다. 나의 축복이 그대의 행복일 것으로 착각한 것일까.
아내와 사무실 동료에게 희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기대했던 반응보다 차분하게 느껴졌다. 환호하며 기뻐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축하한다”는 의례적인 인사로만 들려 섭섭한 감이 들었다. 나의 축복이 그대의 행복일 것으로 착각한 것일까.
“당선되면 축하금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기자가 별도로 등단이 필요한가요. 그냥 글 쓰고 책 내면 되잖아요.” 아내의 볼멘 목소리가 들렸다. 주변에서 시인 등단하는데 몇 백만 원 들었다는 소리를 들었단다. “등단한 책 많이 사줘야 할 텐데요. 그래야 주최 측도 운영이 되잖아요. 동료의 실무자다운 현실적인 목소리가 뒤를 잇는다.
수상의 기쁨보다 부담을 염려하는 것이란다. 세상이 왜 이래? 탄식이 저절로 나왔다. 어렵게 등단하는 신인 문학도를 모욕하는 것 같아 불쾌했지만, 주변에 떠도는 낭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세태를 탓할 수밖에. 사실 문학지를 발행하는 지인들도 있고, 등단 축하를 보낸 시인도 많다. 일각에서 출판 비용이나 심사비를 요구한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실체는 없었다. 공식 답변은 수상 작품이 실린 잡지를 필요한 만큼 구입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장되게 왜곡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들로 인해 전체 문학인들이 매도되는 것 같아 씁쓸했다.
뿐만 아니라 당선이나 합격, 학위취득 등 기쁜 소식을 들으면 축하해 줘야 하는데 별것 아니 것으로 치부하고 애써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플 것이 아니라 함께 축복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수필가로 등단을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고 계간 「문예추추」 신인 문학상 작품에 응모했었다. 나름대로 공신력과 권위가 있는 문학단체라고 판단해 선택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사에서만 활동하다 보니 칼럼이나 인터뷰 기사를 많이 쓰게 되고, 자신의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았다. 언론이 이성적·개관적 글쓰기라면, 문예작품은 주관적·감성적 글을 쓸 수 있다. 지인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해 등단을 목표로 공모에 신청했었다.
기자는 매체가 있어야 글을 쓸 수 있지만, 작가는 어디든 쓸 수 있어 신인 문학상 당선의 의미가 남다르다. 이제 등단 작가로서 당당히 글을 쓰고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 등단의 의미가 더욱 크게 와닿는다.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