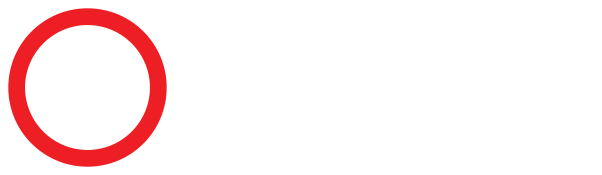전병열 칼럼 l 새해 새날 새 희망을 심는다
“코로나 사태가 일상을 빼앗고 이산가족까지 만들고 있으니 정마저 멀어질까 두렵다. 설 풍속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설날만큼은 새해의 의미를 갖고 싶다”

또다시 한 해가 밝았다. 언제나처럼 새해 새날은 새 희망으로 부푼다. 몇 년간 계속된 경제 침체에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덮쳐 전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지만, 새해는 찬란한 희망으로 다시 솟아올랐다. 지난 아픔의 흔적을 지우고 새 희망을 심을 수 있도록 또다시 기회의 문을 열었다. 다시 일어나자고 외치며 내일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그래서 새해가 기다려진다.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다짐하며 연말을 힘겹게 마감하고 새해를 기대한다. 수년간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동기를 부여한다. 이것마저 없다면 일상을 빼앗겨버린 많은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지치거나 미래를 잃고 방황할 것이다.
나는 새로운 시작이 일 년에 두 번이다. 새해가 있고 설날이 있다. 새해는 비즈니스의 시작이며 설날은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날이다. 지치고 힘들 때는 새해, 새날을 기다리며 참고 이겨낸다. 나에게 새해와 설날은 각별한 의미와 추억이 담겨있다.
사실 새해는 양력설이라는 의미로 인생에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 신정(新正)으로 불리면서 음력설을 구정(舊正)으로 2중 명절을 지내온 세대로서 당시는 해가 바뀌는 정도의 의미만 있었을 뿐이다. 그러다 양력이 중요시된 때는 공식 일정이 양력으로만 공표되고 일상생활에서 음력 일정이 사라지고부터다. 생일이나 제례, 명절 등 음력 일정은 달력에 표기를 해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양력이 생활화돼 버렸다.
우리 선조들은 전통적으로 음력을 수호했지만, 1896년 1월 1일(음력 1895년 11월 17일·고종 32년) 태양력이 도입되면서 양력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명절만큼은 음력을 고집했으며, 특히 새해의 의미를 설날로 기준을 삼았었다. 그러다 일제 강점기 때는 우리 전통 고유문화를 말살시키겠다는 정책으로 설 명절마저 억압했다. 이는 광복 이후에도 계속됐으며, 설날을 구정이라 칭하고 차례마저도 신정에 지낼 것을 강요했다. 산업화 시대에는 국제적으로 신정이 통용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새해인 설날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으며, 결국 1985년 ‘민속의 날’로 지정되고 1일간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정을 쇠는 가정들이 많았었다. 하지만 다수 국민의 끈질긴 요구로 1989년 음력 정월 초하루부터는 ‘설날’이라는 이름을 되찾게 되었고, 신정은 3일간 연휴에서 2일로 줄어들었다가 1999년 1월 1일부터 하루 휴일로 축소됐다. 대신 우리 고유 명절인 설날은 3일 연휴로 확장돼 오늘에 이르렀다.
구정과 신정이 함께할 당시는 12월은 망년회(忘年會)가 많아 퇴근 후는 거의 술자리에 불려 다니다시피 했으며, 31일은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카운터다운(countdown)으로 새해를 맞이한 적도 있었다. 양력설을 새해로서 신성시하기보다는 의례적인 일과성으로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구정에는 꿈에 그리던 부모형제를 만나기 위해 열차에 짐짝처럼 실려서라도 고향을 찾았으며, 하루뿐인 휴일이지만, 그리움이 피로조차 잊게 만들었다. 설날에는 부모님께 세배를 올리고 조상의 차례를 모시면서 진정으로 새해의 희망을 염원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했다. 설날이 새 희망을 심어주고 성장 동력이 된 것이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일상을 빼앗고 이산가족까지 만들고 있으니 정마저 멀어질까 두렵다. 설 풍속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설날만큼은 새해의 의미를 갖고 싶다. 임인년 설날에는 새 시대 새 희망을 이룩하고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빌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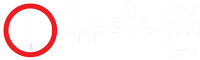
![[기고] 6.3 지방선거,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선택이 지방자치의 미래를 결정한다](http://newsone.co.kr/won/wp-content/uploads/2026/02/유재영-정책위-238x178.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