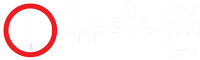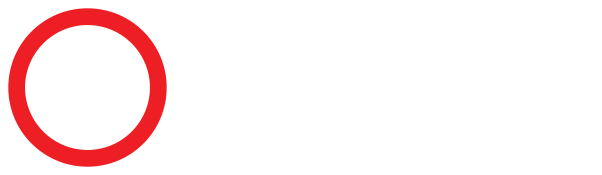“집에 책장이나 서고가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디지털 시대에 웬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퇴박맞지 않을까.

“신인 문학상 당선을 축하합니다. 당선 소감문을 작성해 보내주십시오.” 뜻밖의 희소식에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글을 쓰는 직업이지만, 그동안 불만스러운 글을 쓸 때가 많아 부담됐었다. 직업적으로 프레임에 맞추다 보면 글 쓰는 즐거움보다 스트레스가 가중될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자유롭게 자신을 위한, 자기의 글을 쓰고 싶다는 욕망이 솟구친다. 글을 쓰는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다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노트북을 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늘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핑계를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존경하는 지인의 늦깎이 등단 소식을 접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신인문학상 공모에 도전한 것이다. 직업적 글쓰기에서 떠나 취미 생활로 즐기고 싶기도 했지만, 마음으로는 전문작가로 불리길 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언론사에 근무하면서 칼럼집과 인터뷰집 등을 몇 권 출간했으나 만족스럽지 못했다. 대학에서 후학들에게 언론 문장 등을 강의하면서도 틀에 박힌 문법이라 아쉬움이 많았다. 장래 문학가로서 자신이 쓴 글을 지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고자 문학상에 응모한 것이다.
얼마 후 당선작이 실린 「문예춘추」 ‘봄호’가 수십 권 보내왔다. 지인들에게 등단 소식을 전하고 싶어 출판사에 주문했었다. 막상 보내고자 주소록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 문자 등 SNS 서비스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주소록이 필요치 않아서 한구석에 밀쳐둔 기억을 더듬어 책장 속에서 찾아냈다. 주로 소포나 택배, 주요 문서 등을 우송할 때는 주소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주소록에 등재된 면면을 살펴보며 골라내면서도 망설였다. 나에게는 소중한 책이지만, 그에게는 별로 필요치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문자로 등단 소식을 알리면 될 텐데 짐스럽게 책을 보냈다며, 쓰레기로 처리될 수도 있다는 노파심도 생겼다. 사실 소장 가치도 없는 책들이지만, 막무가내로 폐지 처리되는 게 안타깝기도 했다.
어릴 때는 만화책을, 청소년기는 무협지를 날밤 지새우며 열독했지만, 모두 친구나 책방에서 빌려 읽었다. 어쩌다 한 권이라도 구입하면 보물처럼 보관했었다. 소싯적에는 이삿짐의 절반이 책 꾸러미가 차지하기도 했다. 그만큼 책에 대한 애착이 강했었다. 책을 버리는 게 마치 귀중품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다. 우리 집 서고에는 지금도 무협지에서부터 문학서적, 전문서적, 교재 등이 잔뜩 쌓여 있다. 아내의 핀잔으로 골라서 내다버리고 있지만, 아직도 책은 소모품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책을 출간하면 가까운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그럴 땐 반드시 ‘이 책을 받아 잘 간직해 달라‘는 의미로 ’惠存(혜존)‘이라는 단어를 쓴다. 문제는 집집이 아이들 교재나 참고서를 비롯해 책들이 넘쳐난다는 것이다. 도회지의 좁은 공간에서 책이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책장이라도 있다면 가치 있는 책들은 잘 보관할 테지만, 나이가 들면서 책장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이웃들이 늘어난다. 신문·잡지도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던 시절은 전설이 되고 있다. 귀중한 책들이 폐지로 취급되고 있는 시대에 혜존이라는 의미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문학지가 그에게 무슨 소장 가치가 있을까. 차라리 惠存이라는 단어를 빼고 ‘한번 읽어 봐 달라’는 정도로 기대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 “집에 책장이나 서고가 있나요?”라고 묻는다면 “디지털 시대에 웬 뚱딴지같은 소리냐”고 퇴박맞지 않을까. 그렇지만 이 문학지가 오래도록 그의 책장을 장식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내고 싶다.
전병열 편집인 chairman@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