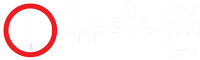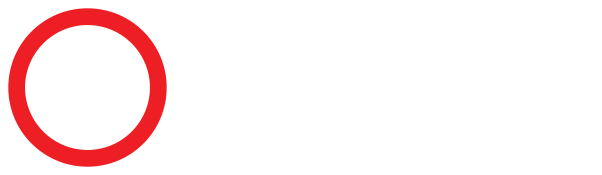친환경, 관광자원으로서의 트램이 가야할 길
 50년 전 부산에서 사라졌던 트램(노면 전차)이 부활한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무가선 저상 트램 우선 협상 대상으로 부산 남구 ‘오륙도선’이 선정됐다. 유럽이나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여행을 나가야만 만날 수 있던 트램이 국내에서 달리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50년 전 부산에서 사라졌던 트램(노면 전차)이 부활한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무가선 저상 트램 우선 협상 대상으로 부산 남구 ‘오륙도선’이 선정됐다. 유럽이나 홍콩이나 일본 등 해외여행을 나가야만 만날 수 있던 트램이 국내에서 달리게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친환경으로 각광받는 트램
국내에서 트램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세기 말인 1898년 12월 ‘경성전차’가 서울 서대문~청량리 구간을 오갔다. 부산에서도 1915년부터 1968년까지 온천장~서면~시청~영도~운동장을 기점으로 트램이 달렸다. 해방과 전쟁, 뒤이은 산업화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토지 활용 비효율성 등 논리에 밀려 자취를 감췄다.
트램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오른 것은 자동차 중심으로 생긴 도심의 혼잡함과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미세먼지와 스모그 등으로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지금,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에 다시 주목하게 된 것이다.
트램은 도로 노면과 같은 높이의 매립형 레일을 깔아 전기로 운행하는 전차다. 공중에 전선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전선 없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터리로 움직이는 무가선 트램을 사용할 수 있다. 매연 등 환경오염도 없다. 노면에서 타고 내리기 쉬워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다. 지하철에 비해 공사기간이 짧고 건설비가 적다. 1㎞당 건설비가 200억 원가량으로 지하철의 6분의 1 수준이다. 차량도 2, 3개 칸을 이어 붙이면 한 번에 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트램이 지하철이나 고가 방식처럼 별도의 노선이 아니라 차선을 잠식하기 때문에 교통 혼잡을 도리어 부추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무시할 수 없다. 왕복 4차선 도로의 중앙에 트램을 깐다면 심각한 교통체증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램 우선신호제’를 운영하면, 트램이 지나는 도로와 교차로는 승용차와 버스에게 지옥의 도로가 될 수도 있다.
트램 유치 공방전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다. 트램이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갖춰지기 전부터, 전국의 지자체들은 수년 전부터 트램 도입 계획을 앞다퉈 쏟아냈다.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대전과 수도권 지자체 등 트램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는 최소 16곳에 이른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사업 계획에 비해 첫 삽을 뜨게 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다. 트램이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뒷받침이 갖춰지기 전부터, 전국의 지자체들은 수년 전부터 트램 도입 계획을 앞다퉈 쏟아냈다. 부산, 울산, 대구, 인천, 대전과 수도권 지자체 등 트램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지자체는 최소 16곳에 이른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사업 계획에 비해 첫 삽을 뜨게 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한국철도공사의 저상트램 설치 공모사업에는 5개 도시가 뛰어들었다. ‘국내 첫 트램 도시’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쳐지게 된 것이다.
수원시는 사람 중심으로 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사업으로 트램을 꼽았다. 세계문화유산 화성, 전통시장, 스포츠 경기장 등을 도는 노선으로 높은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 강점이었다. 성남시는 유동인구 20만 명인 판교테크노밸리에 트램을 추진해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최적이라는 입장이었고, 청주시와 전주시는 도심재생과 관광의 일환으로 트램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트램공방전의 승자는 부산시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발표한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모’에서 부산시가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50년 만에 트램을 재설치하는 역사성을 강조하며, 1만 가구 규모와 3개 종합대가 모인 ‘오륙도선(경성·부경대~남구 용호동 이기대 입구 1.9㎞)’을 내세웠다. 이곳에는 정거장 5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들어가며, 전체 사업비는 470억원으로 국토부 연구개발사업비 110억원과 시비 36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협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도시철도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실증노선 건설에 들어가 2022년 이후 상용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관광자원으로서의 트램
 트램이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램이 미래 교통수단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시가지 중심을 오가는 트램은 영화에도 자주 등장할 만큼 명물이다. 2층 구조의 홍콩 트램은 홍콩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미지이며, 언덕을 올라가는 리스본의 트램은 리스본 관광객이라면 빼놓지 않고 탑승할 정도다.
철도 강국 일본의 도쿄 아라카와(荒川)선은 교통난을 야기시킨다는 논란 속에 자취를 감춘 여타 트램과는 달리 주민들의 존속 요구에 따라 살아남아 ‘벚꽃열차’로 명성을 떨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과 영화의 배경이었던 도쿄 인근 가마쿠라(鎌倉)시를 지나는 트램 에노덴(江ノ電)은 수용한계를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 수용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다.
하지만 신설되는 트램이 관광자원으로 바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첫 트램’, ‘우리 지역 첫 트램’과 같이 초반에는 신기해서 일부러 트램을 타러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신기한 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연계되어 있는 매력적인 관광 포인트가 있거나, 기존의 유명 관광지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면 관광자원으로서 성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전세계적으로 관광으로 유명한 트램들 중 역사가 짧은 것이 없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고, 트램으로 연결된 곳에 이야기가 생긴다.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생기고,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를 바탕으로 소설이나 영화 같은 문화콘텐츠가 생산되어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면, 외지인들이 콘텐츠 속 실제하고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체험을 하고 싶은 것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관광의 시작이다.
트램은 지하철과 버스에 비해 현저히 속도가 느리다. 느린 트램을 타고 낯설지만 일상적인 공간에서 천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여행의 트렌드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지금. 트램이 지나가는 거리의 역사와 마을 속 이야기에 집중해야 새로운 트램이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