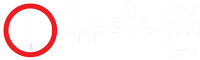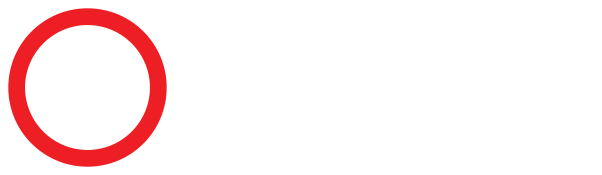전병열 칼럼 l ‘깐부’는 인지상정인가
“깐부를 정치적 · 상업적 가치로 편훼해서 되겠는가. 깐부가 내편 네 편 갈라치기의 상징이 돼선 더욱 안될 것이다”

“우리는 깐부잖아 기억 안나 우리 손가락 걸고 깐부 맺은 거, 깐부끼리는 내거 네 거가 없는 거야” 넷플리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온 배우 오일남의 대사다. 깐부라는 용어가 도처에서 사용되고 있다. 네이버 오픈 사전에는 ‘친한 친구’ ‘짝꿍’ ‘같은 편’ 등을 뜻하는 속어로 나온다. 어원도 미국의 소규모 음악 밴드인 ‘캄보(combo’에서 유래됐을 것이라는 설과 중국의 고사 성어로 관중과 포숙아의 절친한 우정을 뜻하는 관포지교에서 유래됐다는 설, 또 영어 당파나 진영을 의미하는 캠프(camp)에서 유래됐다고도 하는 등 다양하게 추리하고 있다.
권력층에서도 깐부라는 말로 내편을 강조하며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향해 “우리는 깐부 아닌가”라며 우리 편임을 내세우기도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누구와 깐부’라는 말이 대세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내편 네 편으로 편 가르기가 노골화 되면서 부정적인 면을 희석하려다 보니 깐부라는 말을 차용한 것이 아닐까. 학연, 혈연, 지연을 중요시 여기는 연고주의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온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학문의 선후배를 존중하고, 고향의 선후배를 돌보며, 친인척을 챙기는 게 사람의 도리라며 미풍양속으로 이어가고자 했다. 인지상정을 무시하면 후레자식이라며 비난하기도 한다. 이렇듯 순수한 연고주의가 이기주의에 물들면서 이권과 권력 쟁취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연고주의는 자칫 공평성, 객관성, 합리성을 저해할 수 있다. 소위 ‘아빠찬스’ 같은 부조리가 발생할 여지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하기야 나도 권력층에 깐부를 만들었다면 한 자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깐부가 공정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리사욕을 채우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야욕으로 연고주의를 이용하려는 무리들이 도처에서 설치고 있다. 깐부임을 내세워 내편 네 편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진영논리로 장벽을 쌓고 추종 세력을 팬덤 의식으로 무장시킨다. 내편으로 철옹성을 구축하고 정치 신앙으로 지지자를 끌어 모으는 정치꾼들이 설치는 한 국민 통합을 요원할 뿐이다
선의로 맺어진 깐부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하는 현실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동지로서 신뢰하고 양보하면서 배려하다 보면 최고의 깐부가 될 텐데 어느 순간 적과의 동침이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인간의 기본 가치인 존중과 의리, 우정, 신의가 배신과 불신으로 점철되고, 깐부가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코드 판결, 캠프 인사, 승자 독식 등 능력보다는 내편이 더 중요시 되는 세상을 누구를 원망하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세상에 선거는 왜 하는가. 우리도 지역주의와 갈라치기의 일원이 된 지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정의로운 사회가 도래할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정치 시즌만 되면 평소 듣도 보지도 못한 고향 선후배와 친·외척 일가, 동문 선후배가 연고를 앞세워 SNS로 노크를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연고를 들먹이며 접근해 올 때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친목을 목적으로 개설한 밴드나 단체톡에 들어와 장황한 인사말을 늘어놓는 어느 단체장에게 어떤 친구는 “또 선거철이 된 모양이네” 하고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휴대폰에 낯선 전화번호가 뜨면 받을까 말까 망설여진다. 평소에는 영업 전화로 시달림을 받고 선거철에는 홍보 전화 벨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
상부상조는 우리 고유의 상생 문화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에서 배려하고 베풀면서 봉사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보편적인 희망이다. 하지만 지나친 이기심으로 상부상조의 정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다. 봉사단체에 가입해서는 봉사는 뒷전이고 친목을 우선시 하며 그 우정을 자신의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다.
깐부를 정치적 · 상업적 가치로 편훼해서 되겠는가. 깐부가 내편 네 편 갈라치기의 상징이 돼선 더욱 안될 것이다. 깐부라는 말이 인지상정의 지속 가능한 언어가 되길 감히 기대해 본다.
전병열 본지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