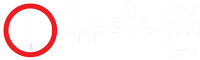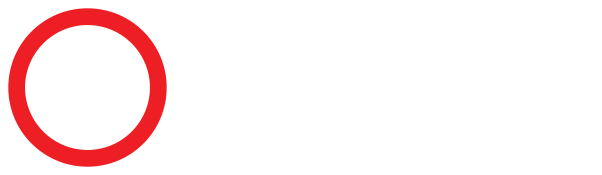“벌초는 묘지를 조성한 집안의 연중행사다. 벌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다면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벌초는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유산이다. 숭조 정신 함양과 가족의 돈독한 화목을 위한 아름다운 전통이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벌초하고 회식한다. 객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친인척들이 회포를 풀며 정담을 나누는 행복한 시간이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벌초 대행업체가 성행하고 있다. 시간이나 생활에 쫓기는 후손들에게는 유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생활의 여유가 있는 데도 벌초를 기피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힘들고 대가가 없다는 단순한 의식 때문이라면, 선조께서 유산으로 물려준 벌초의 본질이 왜곡된 것이다.
“삼촌 돈 보내드릴게요. 사람 사서 하세요. 왔다 갔다 하는 비용과 고생할 걸 생각하면 대행업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조카한테서 온 전화라며, 서운해하는 친구의 표정이 안쓰럽다. 나는 처음부터 동생들이 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우리 집안의 벌초는 삼촌, 당숙, 사촌들이 함께했다. 이날은 일 년 만에 만나는 집안 잔칫날이었다. 소싯적에는 대가족이 모여 제사를 함께 모셨지만, 자녀들이 객지로 제사를 모셔가면서 벌초 때나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다 점차 세대가 바뀌면서 벌초 날을 맞추기가 어려워져 집안을 분리해 혼자서 조부모와 부모 산소를 돌봐왔다. 서울에 살고 있는 동생들이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추석 때 만나자며 혼자서 감당해 왔다. 점차 세월이 가면서 힘에 부쳤지만, 아내와 아들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었다. 사실 농사일을 많이 해보지 않아 이틀 동안 예초기를 매고 다니는 게 여간 힘 드는 일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산소에 있는 농장 제초도 함께해야 하므로 벌초를 마치면 온 근육이 고통스럽다.
“농장 잡초는 겨울에 다 얼어 죽을 텐데 그냥 묘소 잔디만 깎고 그대로 두세요.” 아들의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무성한 잡초를 외관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깔끔히 마무리했다. 하지만 덕분에 며칠간 쉬어야 했다.
한편으로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6남매의 대가족이었지만, 다음 세대는 남매뿐이다. 조카들이 있지만, 선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참여를 강조할 수도 없다. 아들 혼자 감당하기에 벅찰 것 같아 20여 리 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조부모 묘소를 이장해 모을 계획이다. 사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책임감과 정성이 있어야겠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점차 소홀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만 더 한다.
“할아버님께 큰절을 올려라. 너를 참 귀여워하셨단다. 하늘나라에서 지켜보시고 대견해하실 거다” 벌초를 끝내고 간단한 제수를 올린 다음 부모가 참배하고 귀여운 아이들에게 절을 올리게 한다. 벌초하면서 이웃 묘지를 눈여겨본 흐뭇한 광경이다.
“이 근처에 묘가 있었는데 보이질 않네. 힘든 타향살이로 수년간 성묘를 못 했더니 잡초에 묻히고 봉분까지 허물어졌으니 더 찾기가 어렵네.” 인근에서는 중년 부부가 연신 땀을 훔치며 숲속을 헤맨다. 그동안 호구지책 때문에 잊고 지냈던 조부모 산소를 형편이 좀 나아지자 찾아 나선 것이다. “잡목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맞을 겁니다.” 보다 못해 나서서 찾아 줬다. 예전에 우리 산소 옆에 묘지가 있었지만, 찾는 이가 없어 점차 소멸하면서 묘지를 분간하기 어려워진 곳이다. 다행히 후손이 나타나 실묘(失墓)를 면할 수 있었다. 그들은 참회하며 큰절을 올리고 나에게도 고마움을 표했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며 그동안 죄스러웠던 심경을 토로했다.
이기적이고 편안함만 추구하는 MZ세대들에게는 별천지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벌초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면 아름다운 풍습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고역일 뿐이다. 단순히 시간과 노력만 생각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벌초는 묘지를 조성한 집안의 연중행사다. 벌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지닌다면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다. 모두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해 본다.
글 전병열 발행인 / 정치학박사·수필가 chairman@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