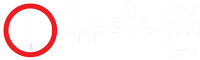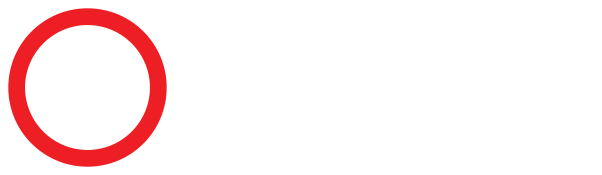[전병열칼럼]연말연시 의미를 되새기며
“연말연시의 의미는 잃고 싶지 않다. 새해 새 희망을 품고 열정과 의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에는 연말연시 메시지가 넘쳐나지만, 감동이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연만연시의 의미가 점차 퇴색해지는 느낌이다. 그만큼 열정이나 의욕이 감퇴한 것인가 보다. 아직은 아니라고 애써 부정해 보지만, 올해는 유독 연말연시가 새삼스럽지 않다. 그래도 마음가짐은 평소와 달리 지난 일을 잊고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돌이켜 보면 매년 맞이하는 연례행사지만, 그런 과정에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장해왔다. 힘겹고 어려울 때일수록 연말연시가 기다려지곤 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때는 새 희망을 품고 힘차게 솟아오를 새해 일출을 맞이하기 위해 해맞이 명소를 찾아 나서기도 했다.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해맞이 명당에는 선점을 위해 새벽부터 자리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어떤 때는 휴가를 내서 하루 전에 출발하기도 하고, 새벽부터 교통체증을 뚫고 달려갔지만, 주차장이 만원이라 도로에서 일출을 맞이하기도 했다. 태양을 향해 합장하고 소원 성취를 기원하며, 새해 비전을 그려나갔었다.
소싯적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동료들과 카운터다운으로 새해 새날을 맞이하고 브라보를 외치기도 했다. 직장과 친목회 등에서 망년회·신년회가 이어졌지만, 피로를 모르고 쫓아다녔다. 그때 그 추억들이 그 시절을 그립게 한다. 그 당시는 연말연시를 축제로 맞이했지만,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는 느낌이다. 세대는 물론 환경 변화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함께 정열을 불태울 벗들조차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나에겐 그만큼 연말연시의 상징적 의미가 컸었다. 연말연시가 절망에서 희망을 안겨주는 변곡점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물론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가 일상의 변화를 초래했지만,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그 시절로 돌이킬 수는 없을 것 같다. 정치적·경제적 환경도 그때 그 시절과는 판이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경제 불황은 끝 간데없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데다 사회적 비극이 잇따르면서 국민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정치를 외면하고 살고 있지만, 현실은 정치꾼들의 견강부회(牽強附會)적 궤변과 후안무치의 작태가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터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불변의 진리로 신봉하는 당리당략적 진영논리와 내로남불, 헤게모니를 위한 이전투구(泥田鬪狗에는 국민이 보이질 않는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로지 정당과 사리사욕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으니, 국민은 갈 길을 잃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망 속에 정권이 교체됐지만, 거대 야당에 발목이 잡혀 개혁은커녕 자칫 공약조차 실종될 처지다.
더욱 가관(可觀)인 것은 ‘과이불개(過而不改)‘라는 것이다. 잘못했다면 고쳐야 하는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적반하장이다. 과이불개는 교수들이 올해 뽑은 사자성어다. 모르는 게 약인데 뻔한 사실을 모르는 체할 수 없다 보니 울화만 치솟는다. 마음 편하게 나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냐고 자위도 해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나만 비운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지 않는가. 함께 고민하고자 작은 목소리라도 내봤지만, 그들만의 리그전에는 쇠귀에 경 읽기일 뿐이다. 속 끓이면서 지켜볼 수밖에.
또 한 해가 저물고 계묘년 태양이 찬란하게 솟구치며 온 누리에 광명을 나눈다. 권력도, 재력도, 명예도 차별하지 않는다. 태양은 세파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태를 지키며 본연의 소임을 다한다. 예전같이 해돋이 명소를 찾지는 않았지만, 연말연시의 의미는 잃고 싶지 않다. 새해 새 희망을 품고 열정과 의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사회일수록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평소의 의지를 지켜나가고 싶다. 자칫 자존감까지 잃을까 두려워서다. 연말연시의 의미를 다시 찾아야 한다. 새해가 나를 부르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