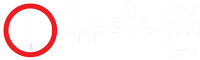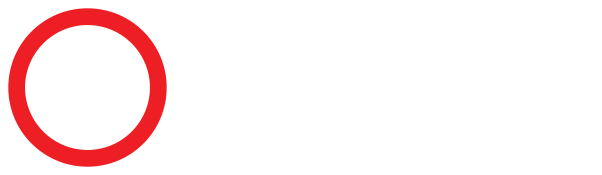“어머님이 손수 싸릿대를 묶어 만드신 빗자루로 마당을 쓸 때는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진다.”

“여보, 어머님이 이상해요, 빨리 오세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가 당황스러웠다. 아침 출근길에 병원에 들러서 문안을 드리고 왔기 때문이다.
택시로 급히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어머님은 이미 말문을 닫으셨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셨다. “엄마! 제가 왔어요. 눈 좀 떠보세요.” 소리쳐 불러봤지만, 결국 숨을 거두셨다. 어머니의 따뜻한 얼굴을 부여잡고 울부짖었지만, 서서히 식어가는 체온은 되살릴 수 없었다.
고향에서 홀로 논밭을 일구시며 사셨던 어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변고가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제발 농사일 그만두시고 편히 지내시라”는 자식들의 신신당부를 귓전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 화도 내고 사정도 했지만, 한 뼘의 땅이라도 놀리지 않겠다는 고집을 꺾지 못했다. 무리하지 말고 소일삼아서 하시라는 권유밖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한 달 전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쁘다는 연락을 받고 부산으로 모셔 와 성분도 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렸지만,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다. 얼마 후 부산대학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진을 해보기로 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괜찮다”며 입원을 거부하셨지만, 병원에 가신 김에 다른 데도 진찰을 받아보자며 강권(?)해 종합검진을 받았다.
그 결과 췌장암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고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당신이 알면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서다. 수술도 불가능하다며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는 주치의의 통고였다. 동생들과 의논 끝에 부산의료원으로 모시기로 했지만, 병원을 옮기신 지 15여 일 만에 운명하신 것이다. 차라리 고향으로 모셔서 마을 친구들, 친지들과 마지막 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라도 드릴 걸, 정말 이렇게 빨리 가실 줄이야. 후회스러웠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평소의 지론대로 그렇게 성급히 가신 것 같다. 가족들의 통곡에 하늘도 울며 궂은비를 내리는 가운데 선산의 아버님 곁으로 모셨다.
생전에 못 해 드린 일들만 응어리로 남았지만,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언제나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지난 음력 7월 3일 어머니를 추모하며, 15년 전 당시를 소환해 본 것이다. 우리 가족의 휴가를 한여름인 어머니 忌日(기일)에 맞추자는 암묵적인 약속이 그동안 잘 지켜지고 있다. 제사를 모신 다음 날 부모님 산소에 들러 그간의 안부를 고하자, 어머니의 안부를 전하는 듯 매미의 노랫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온다. 자랑스러운 당신의 아들딸 6남매가 함께 문안을 드리니 어찌 반갑고 기쁘지 않았겠는가. 노랑나비가 반기며 춤을 춘다.
지금은 매실나무가 울창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당시는 우리 가족의 양식인 고구마밭이었다. 주렁주렁 달려 나오는 고구마를 한가득 부대에 담아 아버님은 지게에 지고, 어머니는 머리에 이고 나르셨다, 우리는 맨발로 고구마밭의 부드러운 흙 이랑을 헤치며 고구마를 주워 담던 행복한 그때의 모습이 선하게 주마등처럼 스쳐 간다. 농사일의 힘겨움을 텃밭을 가꾸면서 직접 느껴본 지금에서야 부모님의 고달픔을 헤아린다. 지금 생각하면 불효막심이다. 장마로 인해 무성해진 산소를 벌초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고향집에 들러 정원 한 곳에 마련한 야외 솥에다 옻닭 백숙을 끓이고자 장작불을 지폈다. 어머님 생전에 가마솥에 끓여 주시던 그 맛을 느끼고 싶었다. 창고에는 아직도 곳곳에 부모님 손때가 묻은 농기구가 그대로다. 어머님이 손수 싸릿대를 묶어 만드신 빗자루로 마당을 쓸 때는 어머니의 손길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해진다. 생각 같아선 부모님의 유물로 보관하고 싶지만, 그 감동이나 느낌을 모르는 아이들은 쓰레기로 취급할 것이다.
어머니의 땅인 논에 오르니 잡초만 무성해 면목이 없다. 이곳을 내려다보신 어머님의 애간장이 궂은비로 변해 내 마음을 적신다. 추억이 품은 그리움을 그리는 날이 기일인가 보다.
글 전병열 본지 발행인 chairman@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