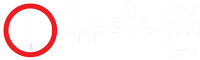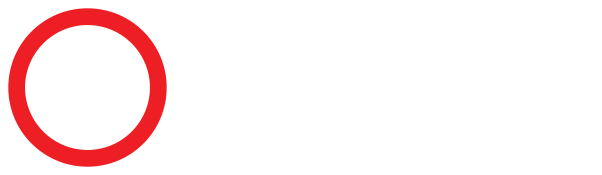<전병열의 작은 행복>
“요즘의 MZ 세대들에게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무용담’이며,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다”

장마의 시작을 알리며 광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밤새 초목을 울렸다. 이른 아침 창가에 자리를 잡고 녹차 잔을 기울이며, 싱그러운 녹색 잎들의 향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켜 본다. 빗줄기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시원한 바람이 나뭇잎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그것도 잠시 또다시 강한 빗줄기가 초목을 두들긴다. 후드득거리는 빗소리가 삼라만상의 소음을 삼키고 가슴을 적시며 아련한 추억 여행이 시작된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어릴 적 기억이 별로 없다. 유달리 유년 시절의 기억을 뚜렷이 떠올리는 친구들을 만나면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다. 총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난 왜 그 시절의 기억들을 잊은 것일까. 사람마다 들추고 싶은 추억이 있고, 감추고 싶은 기억도 있다는데, 추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었기에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가 보다.
더 이상 상실되기 전에 남아있는 추억의 편린들을 모아보고 싶다.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짚고 싶어 진 것이다. 그래야만 남은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아온 것 같지 않다. 무언가에 쫓기고 이끌려 온 인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원하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온 삶이 아니라 생활에 쫓겨 본의 아니게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싫어도 참고 견뎌내야만 했다. 실패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었다.
청운의 꿈을 품고 내일을 향해 달렸지만, 세상은 녹록하지 않았다. 내가 정녕 가고자 하는 길은 아니지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로 자위하며, 앞만 보고 뛰었다. 불확실성 시대를 살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대처해야 했고, 생존 전략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코 후회스럽지는 않다. 그게 인생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직장이 곧 생명이었고, 회사가 인생이었다. 생산에 쫓겨 주말마다 철야근무를 했고, 1·3주가 쉬는 날이었지만, 특근으로 온전한 휴일은 생각지도 못했다. 잔업이 없는 날이 오히려 이상했다. 내심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당시는 개인 생활은 뒷전이고 회사가 우선이었다. 물론 당시에도 직장 보다는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생활을 억누르고 직장에 충성을 다했다. 회사의 지시에 순종하고 회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경쟁에서 살아남고 남보다 앞서 승진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다.
그렇게 열심히 달린 결과 최 단기 최고 승진의 영광을 안았으며, 대통령 표창까지 받을 수 있었다. 당시 함께 노력했던 동료들이 눈에 선하고 그리움으로 밀려온다. 불공평한 환경에서 나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 성공의 열쇠였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길이었겠지만, 나에게는 목숨을 건 사투였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했다. 다행히 입대 전 취득한 자격증이 취업 문턱에서 유효하게 작용했지만, 평소 내가 원하는 직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요즘의 MZ 세대들에게는 전설 같은 이야기지만,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무용담’이며,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다.
이젠 내 인생의 길을 찾고 싶다. 내일을 위한 삶이 체질화된 인생이라 쉽지 않지만, 내일보다는 오늘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정원에 쏟아 붓는 장대비 소리가 침묵을 깨고 가슴을 뛰게 한다.
<본지 편집인 chairman@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