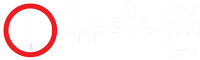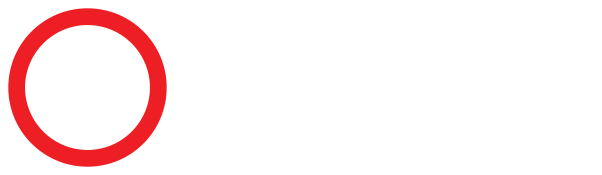지난 2월 21일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뒤로하고 바스티유 광장으로 통하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10여 분 걷다 보니 유독 눈에 띄는 붉은색 굴뚝의 공장 건물과 마주했다.
최근 파리를 찾는 관광객에게 가장 ‘핫’한 장소로 떠오르는 곳은 ‘아틀리에 데 뤼미에르(Atelier des Lumieres)’다. ‘빛의 전시장’이란 뜻의 아틀리에 데 뤼미에르는 공장 건물이 밀집해 있던 파리시 11구의 주물공장을 재생한 전시공연장이다. 이곳에선 매일 후기 인상파의 대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유명 작품 영상물이 100개가 넘는 고화질 대형 빔프로젝트에 실려 벽면을 가득 채운다. 여기에 이동 동선을 따라 영상에 어울리는 음악까지 흘러나와 미술관에 온 건지, 공연장을 찾은 건지 구분하기 힘든 환상적인 체험을 제공한다. 지난해 4월 개관해 연말까지 8개월간 140만 명이 찾았다.
샹젤리제의 낭만적인 밤 풍경이 유명한 파리는 빛의 도시로 꼽힌다. 은은한 조명이 깃든 거리의 고딕양식 건축물과 황금빛 조명으로 물든 에펠탑에 이어 아틀리에 데 뤼미에르의 빛 공연은 파리의 명물로 떠올랐다. 건물 외관은 손대지 않고 내부만 리모델링, 주물공장을 재생한 전시공연장은 파리의 품격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다양하면서도 강렬한 색채와 살아 꿈틀거리는 듯한 화풍의 고흐의 미술 작품은 시각만이 아닌 청각과 촉각으로도 전해졌다. 고흐의 초상화와 ‘빈센트의 방’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등 미술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듯 벽면을 가득 채우며 눈과 귀, 손을 끌어당겼다.
아틀리에 데 뤼미에르는 파리 시내 10여 개 박물관과 미술관을 위탁 운영하는 민간단체 퀼티르에스파스(Culturespaces)가 버려진 주물공장을 인수해 새로운 빛 전시공연장으로 꾸민 곳이다. 고흐의 작품은 이곳에서 빛으로 재탄생했다. 지난해 개관 첫 작품으로 올린 ‘구스타브 클림트(Gustav Klimt)’와 ‘에곤 실레(Egon Schiele)’ 등 19세기 아티스트의 작품도 8개월간 140만 명의 관람객을 동원할 만큼 인기를 얻었다.
전시공연장에는 140대의 고화질 빔프로젝트가 설치돼 있어 화려한 미술작품을 건물 천장과 벽면, 바닥에 입체적으로 투사한다. 관람객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50개의 고음질 스피커는 작품에 몰입할 수 있도록 강렬한 사운드를 제공한다.
아트센터가 바꾼 공장지대 = 고흐의 작품을 새로운 예술 장르로 선보인 디지털 아트 센터 ‘아틀리에 데 뤼미에르’는 원래 철을 녹여 그릇 등을 만들던 주물공장이었다. 1835년 지어진 공장이지만 지금도 벽돌구조 외벽과 3300㎡ 내부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쇠붙이를 달구던 보일러와 물탱크, 벽돌로 만든 굴뚝도 옛 모습 그대로다.
주변 도시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아트센터를 찾는 관람객이 늘면서 주변 상권이 되살아나고 거리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 전시장 주변에 20곳이 넘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생겼다. 레바논과 콜롬비아, 모로코 등 다양한 국가의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식당도 넘쳐난다.
아트센터가 들어서기 전 이곳은 파리시 외곽의 전통적 공장지대로 산업발전 과정에서 도태된 여러 공장이 오랜 기간 문을 닫은 채 방치돼 왔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난민과 이민자들이 모여들면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 퀼티르에스파스는 이곳의 한 공장을 인수해 지난해 4월 파리시에서 처음 디지털 미디어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의 예술작품을 선보였다.
폐쇄된 기차역은 세계적인 예술작품을 소장한 오르세미술관(Orsay Museum)으로 탈바꿈하고, 냉동산업의 발달로 사라진 도축장은 파리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라 빌레트 공원(La Parc de la Villette)으로 조성돼 극장과 음악당이 들어섰다. 버려진 공장을 전시장으로 꾸민 아틀리에 데 뤼미에르 역시 이 같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다.
이서연 기자 lsy@newsone.co.kr